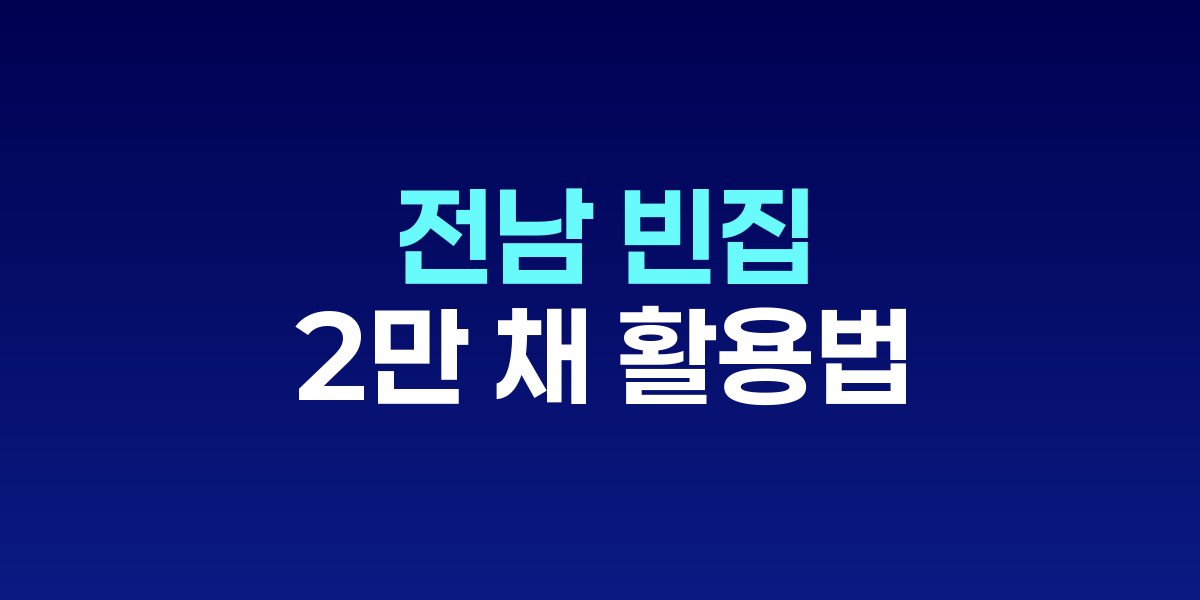
출처 : SONOW
AI와 드론이 만드는 스마트 빈집 관리 시스템
전남 농촌 곳곳에 방치된 2만여 채의 빈집 문제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는 혁신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공무원 현장 답사 중심에서 벗어나 드론 촬영, 빅데이터 분석,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해 빈집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AI 기반 빈집 관리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드론이 촬영한 영상과 위성사진을 컴퓨터비전 알고리즘이 분석해 지붕 함몰 여부, 외벽 균열, 주변 화재 위험물 등을 자동 판독한다. 여기에 거리 내 아동·노인 통행량, 과거 화재·치안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붕괴 위험 빈집을 즉시 식별한다.
이를 통해 빈집을 '즉시 철거 대상(빨간색)', '보수 후 활용 가능(파란색)', '현상 유지 관찰(노란색)' 등으로 자동 분류할 수 있다. 한 건축안전 전문가는 "AI 판정이 들어가면 '위험도 순위'가 명확해져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객관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매칭으로 '수요-공급' 연결
AI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활용 가능한 빈집과 실제 수요를 연결하는 스마트 매칭 서비스다. 모든 빈집이 철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좋거나 구조가 양호한 집은 귀농·청년 임대주택, 창작공간, 노인 돌봄주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AI는 읍내·관광지·산업단지 주변의 임대수요 데이터를 예측하고, 청년·귀농 희망자, 사회적 기업의 공간 수요와 빈집 위치를 자동 매칭한다. '빈집 은행' 플랫폼에서 활용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 추천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빈집"과 "당장 철거해야 하는 빈집"을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특히 AI 문서 자동화 기술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의 경우 통지문·동의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민원 상담 챗봇을 통해 빈집 철거·활용 절차를 안내한다. 빈집 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 구축으로 주민들도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형 AI 파일럿 사업 추진 방안
전문가들은 전남이 여수·목포·순천·고흥 등 빈집 다발 지역에서 1년간 AI 파일럿을 운영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추진 일정은 ▲0~3개월: 빈집 현황, 건축물대장, 인구·교통 데이터와 드론 촬영 데이터 통합 ▲3~6개월: 위험도 분류 AI 모델과 빈집 활용 매칭 플랫폼 시범 가동 ▲6~12개월: 고위험 빈집 70% 철거 착수, 활용 가능 빈집 200동 전환 목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345억원 규모의 해양 AX 지원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AI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성과가 확인되면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전국 농촌 지역에 '전남형 빈집 AI 모델'을 전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재생 전문가들은 "빈집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산"이라며 "AI는 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공실을 넘어 지역 소멸의 경고음이지만, 데이터와 AI를 접목하면 빈집을 '위험'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